'워크니스' 현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사회적·역사적 뿌리는 무엇인지, 폴 그레이엄이 정치적 올바름의 두 물결과 사회 변화, 대학 및 미디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처법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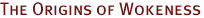
2025년 1월
"프리그(prig)"라는 단어는 이제 흔히 쓰이지 않지만, 정의를 찾아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의미다. 구글의 정의는 이렇다:
타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듯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의미는 18세기에 시작되었고,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워크니스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훨씬 오래된 현상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도덕적 순수함을 표면적으로 집착하며, 규칙을 어기면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회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변하는 건 그들이 지키려는 규칙뿐이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기독교적 미덕이었고, 스탈린 시대 러시아에서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워크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정의다.
따라서 워크니스를 이해하고 싶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묻기보다는, 왜 현재 우리 사회의 프리그들이 이런 생각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리고 워크니스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물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1980년대다. 워크니스는 정치적 올바름(PC)의 두 번째, 더욱 공격적인 물결로,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해 90년대 후반쯤 한풀 꺾였다가, 2010년대 초 사회 전역으로 퍼져 2020년 폭동과 함께 정점에 달했다.
"Woke"의 원래 의미는 이와 달랐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주로 쓰인다. 그렇다면, 지금의 워크니스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워크니스와 정치적 올바름이 무의미한 딱지라 여기며 정의를 요구해 왔기에, 여기에 내 정의를 밝힌다:
사회정의에 대한 공격적이고 과시적인 집착
즉, 사회정의와 관련된 프리그적 행동이다. 문제는 사회정의가 아니라, 그 과시적이고 얄팍한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다(워크들이 생각하는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는 소외집단을 신경 썼다는 데 있지 않고, 너무 얄팍하고 공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 있다. 소외집단의 실제 삶을 개선하진 않고, 잘못된 말이나 표현을 사용했다고 집요하게 사람을 잡는 게 주된 행동방식이었다.
정치적 올바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분명 대학 외부가 아니라, 언제나 대학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또 수학, 이공계, 공학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시작됐다.
왜 인문, 사회과학에서였을까? 이 분야는 연구에 정치적 색을 입히기 쉽고, 1960년대 학생운동 세대가 교수로 진출하면서, 정치적 신념이 업무에 영향을 끼치기 수월했다.
1960년대 학생 시위는 왜 워크니스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들은 실제 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학생 운동가들이 논문을 마치고 교수로 채용되기 시작했고, 점차 수가 늘고, 선배 교수들이 은퇴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
프리그들은 언제나 도덕적 엄격함을 발휘할 대상이 필요하다. 1980년대의 문화 엘리트에게 종교나 성은 더 이상 엄격함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도덕 규칙이 필요했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1960~80년대, 대학 내에서 성희롱 경계가 강화되면서 여성들이 정치적 올바름의 집행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하버드 총장 래리 서머스는 남성의 변이 폭이 크다는 다윈 가설을 언급했다가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퇴진 압박을 받았다. 진실과 안락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대학에서조차 불분명해졌다.
1990년대 후반, 정치적 올바름은 농담거리로 전락하며 다소 힘을 잃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는 불씨가 살아 있었다. 2010년대, 소셜 미디어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더 강력해졌다. 이번에는 대학 내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퍼졌고, 성, 인종, 성소수자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이즘', '-포비아'가 만들어졌다.
이번 유행은 전적으로 소셜미디어, 특히 트위터나 텀블러 덕분에 촉진됐다. 사회 구성원들이 분노를 공유하고, 캔슬(퇴출) 문화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론의 양극화, 신문사가 이데올로기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중립성을 잃은 것도 큰 몫을 했다.
다른 한편으론, 대학과 각종 조직에 '포용(인클루전)' 등을 담당하는 신종 관료직이 생겨, 이들이 워크 규범을 공식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제 워크니스는 일부 사람의 취향을 넘어, 전문적 직업이 되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2013), 미투(2017), 트럼프 당선(2016),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은 워크니스를 더욱 가속화했다. 그러나 2020~2021년 정점에 오른 뒤, 기업, 대학, 미디어 등에서 점차 후퇴 중이다. 소비자들은 워크에 지나치게 치우친 브랜드(예: 버드 라이트 맥주)를 거부하고 있다. 대학들은 언론의 자유를 재확인하기 시작했다.
워크니스를 종교와 유사하게 대해야 한다. 즉, 각자 워크 신념을 표현할 자유는 인정하지만, 조직이나 사회 전체의 규범으로 삼아선 안 된다. 워크 신념을 강제하지 않고, DEI(다양성, 형평, 포용) 서약서같은 것을 요구하지 말며, 워크적인 이유로 작가나 학계를 검열하지 않는다. 마치 종교적 신념을 조직에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워크 관점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없다. 기독교 원칙 중에도 현명하고 좋은 것이 있듯, 워크가 주장하는 일부 도덕적 직관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진정한 다원주의만 지키면, 워크 통제의 새로운 유행이 다시 대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일반적인 해결책은, 사회 전체가 '새로운 이단' 규정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는 것이다. 누군가 기존에 가능했던 말을 금지하려 할 경우, 그 논증책임은 금지하려는 쪽에 있다. "해악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론 부족하며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워크니스를 비롯한 과시적 도덕주의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새로운 규칙과 금지어가 난립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진실의 수가 늘어난다면, 사회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주석 중 일부 발췌:
감사의 말: 초안 검토에 도움준 Sam Altman, Ben Miller, Daniel Gackle, Robin Hanson, Jessica Livingston, Greg Lukianoff, Harj Taggar, Garry Tan, Tim Urban에게 감사드립니다.